
|
|
이기철 시인 |
‘신문ㆍ텔레비젼 소멸’이라는 책을 낸바 있는 저널리스트 사사키 도시다오가 쓴 ‘전자책의 충격’은 이런 의문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사실, 책뿐 아니라 세계는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개를 펼친 지 꽤 된다. CD나 레코드판도 이미 구닥다리 신세가 되고 말았고 간혹 과거에 대한 향수와 당시 시대 감성을 반영한 레트로(retro) 풍으로 소환될 뿐이다.
종이책 붕괴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e-mail’이 언젠가부터 ‘e’가 빠지고 ‘mail’로 통용되듯 ‘e-book’도 그저 ‘book’으로 인식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한다. ‘전자책이 책을 가리키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옛날 중국 기(杞) 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라고 침식(寢食)을 잊고 걱정했다는 말에서 생긴 ‘기인지우’(杞人之憂)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이른 느낌이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콘텐츠를 담는 그릇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여전히 오롯이 담겨있다.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석판이든 거기 기록된 문자는 여전히 해석되고 읽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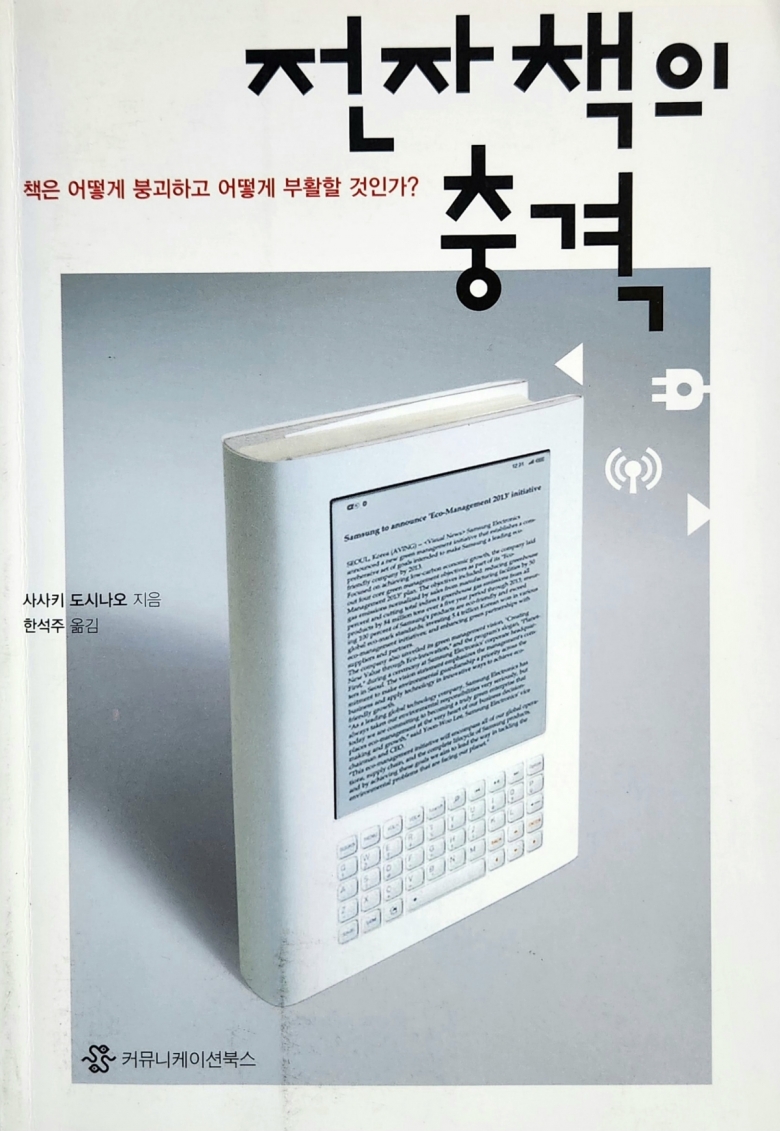
|
| ‘전자책의 충격’ 책 표지. |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아이패드’ 열풍이 불던 때를 상기시킨다. 특히, 출판계는 바싹 긴장했다. 그러면서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이야기로 위안을 삼으려 했다. ‘액정 화면으로 책 읽기는 안 통할 것’이라는 자기 위무(慰撫). 하지만 얼마 안 가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에서는 신작을 전자책으로 서둘러 발간했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것이라는 조바심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 전자책은 시작됐다. 1994년, 예인정보가 PC통신 하이텔에 ‘예인 전자도서관’을 개설한 바 있다. 주로 텍스트 위주 도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래 가지는 못했다. ‘월드 와이드 웹’(www) 등장으로 통신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바로 북’, ‘북 토피아’ 등도 태어났다가 곧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해야 했다.
이제 플랫폼 기업 역습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이 다양하게 꾸미는 미디어 산업은 출판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된 지 한참이다. 전자책 장점은 서가(書架) 개념을 무색하게 한다. 예를 들면 ‘삼국지’를 알기 위해서 출판된 모든 책을 사거나 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삼국지 모든 책을 모아 놓은 것’에서 ‘삼국지 모든 것을 모아 놓은 곳’으로 진화했으니 말이다. 특정 출판사는 이미 이런 사이트를 구축(지식 아카이브) 회원 가입 등을 통해 마음껏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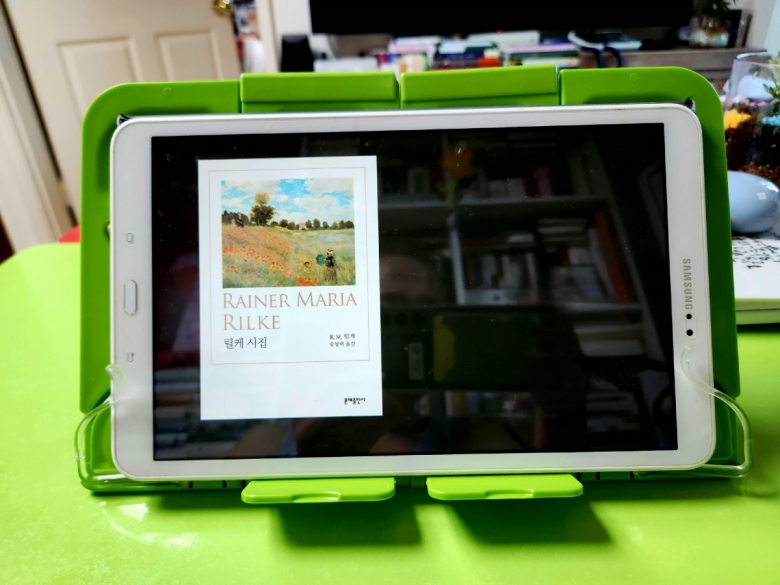
|
| 종종 전자책용으로 사용하는 필자 테블릿PC. |
SNS 시대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독자 참여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완성형을 구축한다면 금상첨화겠다. 무성영화 시대도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시절을 거쳐 지금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뿌리치기 어려운 시대다.
‘책벌레’라고 해서 꼭 종이책에만 코 박고 있는 일도 우습게 됐다.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배포하고 접근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토대이자 공간인 ‘플랫폼’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아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전자책은 전자 시대 유산이고 종이책은 인쇄 산물이다. 이것이 두 책 차이를 이해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는 말처럼 진정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살펴 보여야 할 일이 먼저다. 재빨리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을 일컬어 ‘얼리 버드’(early bird)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얻겠지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다. 속도와 변화도 적당한 보폭으로 챙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조바심으로는 이 책이든 저 책이든 한 페이지도 넘기기 어렵다.
시대 변화에 따른 책임 소재는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지금은 ‘종이책’이 살아남을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말?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