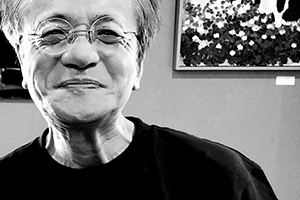 |
| 이기철 시인 |
‘서해의 해변에서 모래 백사장의 완벽한 모습을 보는 건 운이다. 어떤 시간은 물이 차서 해변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새하얀 모래 백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기도 한다. 나는 반쯤 운이 있던 날, 적당하게 반쪽 해변만을 보았다. 한 시간을 앉아 있는 동안 서너 가족들이 다녀가고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지난한 봄날 섬의 해변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지 의식이 생겼다.’
바다에서 생긴 일은 물때처럼 남아 기억에 오래 저장되는 법이다. 에세이집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 바다 이야기는 이제 글이 아니라 사진이다. 2017년부터 3년간 다행히 팬데믹 시대를 비켜선 지점에서 바다를 발견하고 이를 프레임에 담았다. 마치 어부가 그물 그득하게 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진가 박태진 사진집, <서해에서>는 작가 시선이 완전히 새로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상상할 수 없는 경탄, 눈에 보이는 감동을 넘어 보이지 않는 속살까지 소름 돋듯 살려낸 ‘see’에서 ‘sea’로 변환시키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광경인 ‘scene’이다. 그는 이른바 ‘아트 다큐’를 실현하는 포토그래퍼다. 공적 다큐가 특정 사안에 머문다면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개인감정을 확장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증폭시켜 느낌표를 남기게 한다. 매우 영민한 선택이다.
 |
| 사진집 <서해에서> 표지. |
사진집은 지난 3년간 찍어낸 서쪽 바다 수만장을 지난해 1년간 고르고 골라 69장을 실었다. 그는 이 대목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계’를 실감한 현실. 더 보여줄 수 없는 사진들은 후일을 위해 일시 잠금 장치해뒀다. 사진집은 일체 감상을 방해하는 문구를 제거했다. 자막이 전혀 없는 영화처럼. 하지만 한 장 한 장에서 자연스레 주제를 눈치채고 읽게 되고 보게 되며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만 존재한다. 사용한 카메라는 S사 GR 시리즈 하나인 이른바 똑딱이다. 놀랍다. 전혀 손상되지 않은 디테일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사실, 이 사진집 제목은 ‘감정의 리듬’(Rhythm Of Emotion)으로 생각해뒀다고. 작가 시선을 사로잡은 리듬은 다름 아닌 자연과 그 속에 몸을 의탁한 사람들. 주연(主演)은 자연, 사람은 배경처럼 쓰인 조연(助演)에 불과하다. 작업을 하면서 밀물처럼 자신을 휘감던 감정은 익숙을 버리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전율이었다고 자백한다. 사진은 아주 천천히, 깊숙이 섬세하게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일부러 그런 장치를 해둔 것은 아니지만 부호(符號)처럼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라고 종용하지 않는다. ‘저것’이라고 말해도 좋다는 은밀한 배려다.
이 사진 여행에 동행한 이는 ‘자전거’다. 다른 교통수단은 내버려 두고 선택한 이동은 과연 어떠했을지 짐작된다. ‘자주 정지(停止)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구석구석을 돌아봐야 하는 끈기와 현미경 들이대듯 봐야 하는 ‘그곳’을 발견하기 위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했다. 촬영은 하루 만에 끝나는 법이 없었다.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위해 텐트는 필수, 야영 생활은 덤이었다. 사실, 그간 작업은 이번 작업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첫 사진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부터 ‘사진에게 위로받다’, ‘Deliberation’에서는 자유분방한 화면을 창조하기 위해 ‘핸드헬드 쇼트’(handheld shot)를 주로 썼다. 이번에는 이들과 완전히 이별했다. ‘관조’(觀照)를 ‘직시’(直視)로 풀어냈다. 스스로 말한다. ‘정지된 상태는 첫 경험이었다’고.
만 6년 만에 나온 신작 사진집, ‘서해에서’를 위해 전시회와 북 토크가 동시에 마련된다. 내일(4일) 오후 4시 울주문화예술회관. 이 행사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빈달’ 씨가 출연한다. 그녀는 박태진 사진가 딸이다. 이번 사진집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음악이 흐르게 된다. 사진집 맨 앞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아빠를 위한 헌정곡을 들으며 사진집을 감상할 수 있다.
 |
또 하나, 이 책에는 그 흔한 저자 서문이 없다. 대신 지난해 제24회 수주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한 정월향 시인이 서문을 대신한 시를 썼다.
눈 내리는 속도를 이야기한다// 꽃이 둔장길에 떨어진다고/ 발자국이 모퉁이를 지난다고// 바퀴 자국을 덮는 바퀴와 동그란 점을 남기는 개들// 월요일은 끝없이 다가오고/ 발자국 위로 또 다른 발자국이 지나간다// 한 줄기 추위가 앞질러 간다/ 오늘 하루도 길 것이라고// 웅덩이마다 고인 것들이 부글거린다// 지갑을 연다 동전을 꺼낸다 자잘한 것들을 봉투에 담으면서 생각은 더 잘게 쪼개진다 웅크리고 앉는다 담배를 문다 얼굴 앞에서 빛나는 그늘, 먼 풍경이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 <시, ‘그늘과 축복’ 전부>
이 사진집 출간은 부산에 있는 독립출판사 ‘윤이’가 맡았다. 대표 윤창수 씨도 사진가이며 수정갤러리 관장도 맡고 있다. 척박을 옥토로 가꿔나가는 두 사람이 보여준 ‘콜라보’ (collaboration)가 매우 아름답다.
이제 그는 다음 계획을 벌써 도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중심에 둔다. 남해가 먼저일지 울릉도가 먼저일지만 가늠하고 있다.
 |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