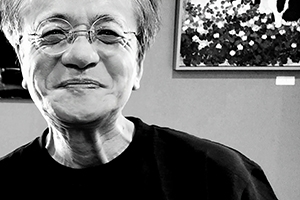
|
|
이기철 시인 |
유년(幼年)을 다시 소환한 중년(中年)이 돼서 그녀가 하고 싶은 지점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닿소리(자음)로 차례를 꾸민 내용은 ‘풀꽃나무’를 ‘풀ㆍ꽃ㆍ나무’로 읽어도 되고, 그냥 ‘풀물’들 듯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 어떻게 가져왔든 그 일은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추억’이 되고 만다. 이렇게 따뜻한 기록은 웬만해서 만나기 어렵다. 이 책은 ‘그때’를 빌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지개처럼 영롱한 어릴 적 고향으로 데려간다.
굳이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음에도 왜 읽는 내내 가슴은 뛰고 즐거움은 뒤쫓아 오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한편씩 불러낸 향수(鄕愁)는 문장이 또 얼마나 정갈한 옹달샘 물 같은지 단맛이 뚝뚝 떨어진다. 간절함이나 애달픈 사연도 ‘먹먹함’보다 깊은 그리움에 더 닿아있다.

|
|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 책 표지. |
작가는 ‘어린 날 보았던 들꽃과 들풀이 소곤거리던 자그마한 수다’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가까운 어제’라는 말에 순간 동의하고 만다. 경북 의성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제 대구라는 도시에 몸을 의탁해 식구와 오순도순 사는 풍경이 가진 원천은 여전히 ‘여우비와 구름, 바람 소리에 근거한다.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들꽃이며 풀꽃을 그리는 생활이어서 스스로 ‘숲하루’라 이름 지었다.
만났던 풀꽃나무들을 거론하면서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찔레나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장미과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미터 정도, 가시가 있으며 잎은 우상복엽이고 잔잎은 긴 타원형으로 톱니가 있다’든지 ‘5월에 흰 꽃이 원추(圓錐)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10월에 빨갛게 익는다’는 따위 설명은 하지 않는다.
대신 ‘찔레는 꺾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배움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재 밑이다. 산 따라 도랑이 길 따라 이어졌다. 도랑에 다리를 걸치고 비탈진 산으로 몇 걸음 오른다. 흙을 밟으면 비스듬하고 흙이 푸석해서 발이 흙하고 같이 미끄러진다. 어떤 날은 주르르 몸이 미끄러져 엉덩이를 찍는다.’고 그 상황, ‘길쭉한 찔레를 앞니로 똑똑 꺾어 씹어 먹은 시간’을 말할 뿐이다. ‘새싹 가운데 살이 통통하고 굵은 찔레가 맛이 좋다’는 아, 그 시절을 몸서리치게 표현한다.

|
| 삽화 ‘분꽃’(p.145, 아일다 作). |
‘삐라’라 불렸던 ‘팔랑종이’를 이야기할 때도 곧장 ‘공산당’이나 ‘북한’을 떠오르게 하는 말 대신 ‘바람은 나쁜 일도 씩씩히 한다. 돌개바람으로 바다를 건드리기도 하고 비를 몰아치기도 하더니 북쪽 풍선을 도와 우리 마을까지 보내고도 숨죽이며 살랑이며 사람들에게 살갑게 구는듯하다. 바람도 피바람이 불던 싸움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듯싶다’며 슬픈 분단(分斷)을 슬쩍 언급할 뿐이다.
뒤늦은 대학교 졸업, 5년간 ‘계공’(계약직 공무원) 생활도 했고,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아이를 훌륭히 키워낸 평범한 엄마다.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곁님’과 대처(大處)에 살면서 조촐하게 가게를 열고 십 년 넘도록 일상을 꾸리고 있다.
집과 일터만 오가다 느낀 갈증을 가시게 한 사건은 ‘책’과 ‘글’을 만난 일.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 ‘글 선생’도 만나봤으나 실망, 자신이 목소리 낼 수 있고 쓸 수 있는 ‘말과 글’로 ‘풀꽃나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결심이 이 책을 태어나게 했다.
‘ㄱ’부터 ‘ㅎ’까지 끌고 가는 닿소리 차례는 무시해도 된다. 제목만 슬쩍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불러내면 되는 매력 있는 책이다. ‘나를 키워준 시골 풀꽃나무 이야기’는 독자 스스로 하고 싶었던 스토리텔링일지도 모른다.

|
| 삽화, ‘채송화’(p.219, 아일다 作). |
작가가 표3에 남겨둔 책 속, ‘감꽃’에 관한 소회(素懷).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감꽃을 주워 모아두고 울타리에 걸린 감꽃을 베어 문다. 어린 날 감꽃이 떠올랐다. 그때 맛이 날까 또 씹었다. 고운 꽃이 달면서도 떫고 쓰다’.
감동은 밀려오는 법이지만 쓸려가는 일도 종종 있다. 살아온 날, 살아갈 날이 ‘밀물’이었다가 ‘썰물’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루를 사는 힘, ‘견뎌옴’, ‘견뎌냄’이다. 지난 7월에 낸 시집, ‘꽃의 실험’에서는 슬픔이란 ‘실루엣’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청명한 아, 옛날이여’다.
시인 김정화, 숲하루 씨는 이따금 우리 배달말로 겨레 삶을 오롯이 드러내는 새뜸(뉴스)인 ‘배달겨레소리’에 삶길 이야기와 시를 쓰고 있다.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