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철 시인 |
탁구장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메운 그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탁구장에서는 핑퐁을 하는 곳,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너나들이하면서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임이 확인된다.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한 몽실탁구장.
‘전편보다 나은 속편’,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정 작품을 사랑하는 이들은 작가를 사랑한다면서도 정작 후속작이 나오면 이번에는 실망했다고 말하기 일쑤다. 독자들이란 그만큼 똑똑한 편견과 편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시인은 대도서관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서사(敍事)를 앞장세워 당당하게 귀환했다. 첫 번째 시집에서는 관등성명(官等姓名)만 또박또박 밝혀 이름 세자만 각인시키는 데 그쳤다. 산문집과 이번 2 시집에 이르러서는 꼭 빼놓지 않는 말이 ‘배우고 나누는 일에 애쓰고 있다’고 적어 뒀다. 이 말은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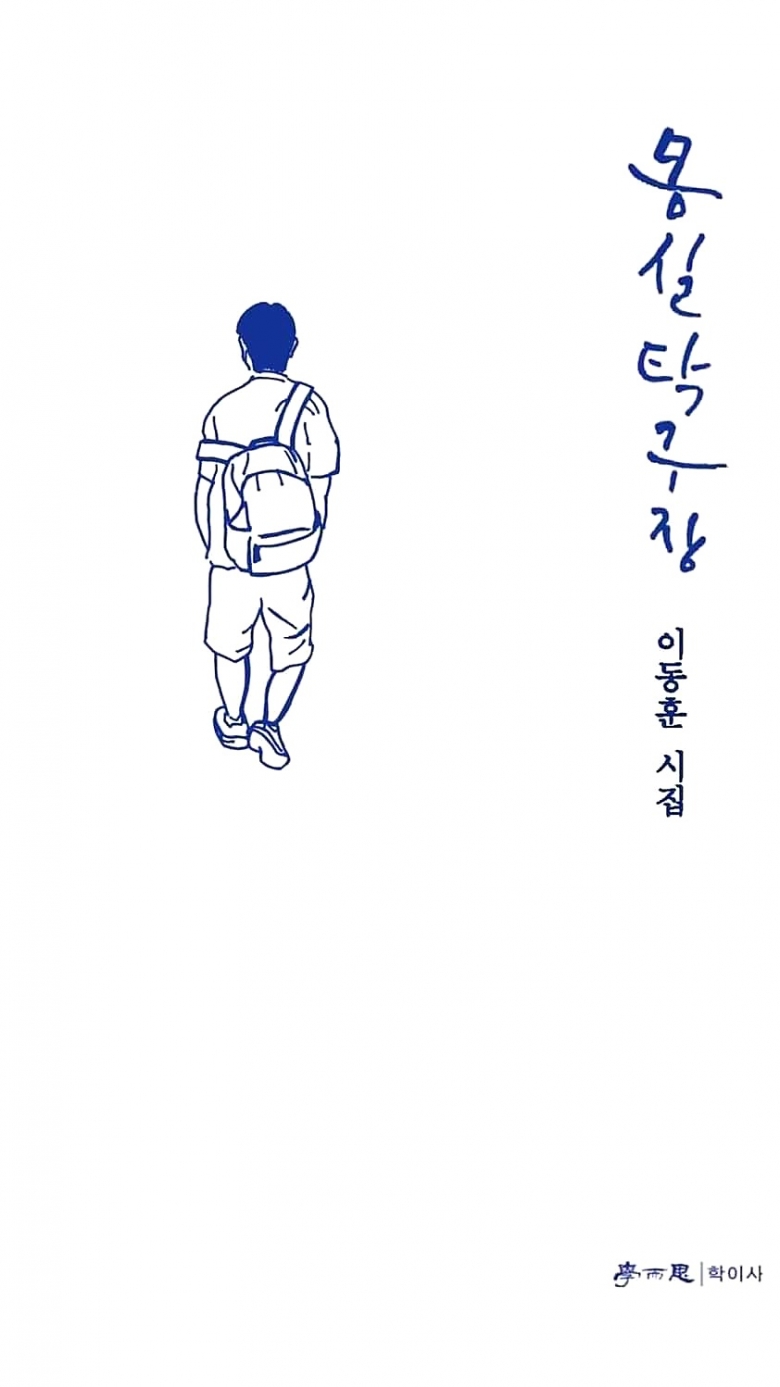 |
| 시집 ‘몽실탁구장’ 표지 |
먼저, 시집을 펼치면 표1에서 탁구 라켓을 손에 쥐고 있는 작가 캐리커처를 보게 된다. 보아하니 왼손잡이인 듯한데 악수하듯 잡는 스타일인 셰이크핸드 라켓이다. 펜홀더 라켓은 좌우 몸놀림이 많아 쉬 지친다. 셰이크핸드 라켓은 고무판이 양면으로 붙어있어 펜홀더보다 더 많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사소한 장면도 시인 속마음을 찾아가는 단서이기도 해서 설명을 애써 했다. 탁구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있다.
‘詩도 탁구도 폼이다’고 당당히 말하는 시인이다. 다만 ‘폼 잡다가 재미 놓칠까 하는’ 걱정은 한다. 하지만 이런 너스레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폼은 시쳇말로 ’폼생폼사‘가 아니다. 시인이 구사하는 고난도 기술(記述)이다. 그가 짓는 폼이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임을 증거물로 내놓은 게 이번 시집이다.
시 한 편이 웬만한 책 한 권이다. 줄줄이 불러내는 역사 속 인물들에 혀를 내두른다. 여기에다 슬쩍슬쩍 얹는 유머는 ’페이소스‘와 진배없다. 시인이 풀어내는 모든 글에는 생사(生死)를 아우르는 정서가 깔려있다. ‘몽실탁구장’ 전편은 사람들을 그려낸다. 그것도 한 번도 생전에 만나본 일이 없는. 채석강 적석(積石)을 통해 가늠하는 세월이듯 그렇게 타임머신을 준비해 둔 시인이다. ‘쌓인’으로 썼지만 ‘깔린’으로 읽어야 한다.
시집 ‘몽실탁구장’는 그렇게 시작된다. 권정생 선생 자전 소년 소설, ‘몽실언니’를 떠올리며 쓴 시가 제목이 됐다. 주인공 몽실이 겪은 간난신고(艱難辛苦)는 뒤틀린 역사에 쌓이고 치인, 결국에는 역사 중심에 서지 못하고 ‘밀려’, ‘깔려’ 절름발이가 된다. 그 절뚝이는 생을 온전하게 받치는 삶이 어찌 아름답기만 하겠는가?
 |
| 왼쪽부터 시집을 낸 학이사 출판사 신중현 대표, 표지 그림을 그린 권도훈 작가, 이동훈 시인. |
이동훈 시인 시는 쉽게 읽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그가 불러내는 수많은 예술인에 의아해한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시집을 출판한 학이사 신중현 대표 말이 정확하다. ‘책값 본전 생각이 난다면 어디든 펼쳐 시 한 편을 세 번만 중복해 읽으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장편 소설 한 편 읽은 감흥이 올 것이다. 십 분 만에 장편 소설 한 편을 읽게 되면 책값의 몇 배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독자에게 바라는 바이며, 또한 주는 선물이다’. 장삿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시, ‘외투’를 읽으면 단박에 수긍하게 된다.
러시아 작가, 고골 작품 제목이다. 이 시에서는 외투 한 벌을 확장시켜 여럿에게 나눠 입힌다(?). 유치환과 김소운, 미제 낙타 외투에 대한 시인 김수영이 느낀 부끄러움, 이소선 여사가 아들 전태일에게 준 외투의 행방, 급기야 올해 초 눈 내리는 서울역 앞 노상에서 커피값을 구걸하는 노숙인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선량한 사내까지 등장시킨다.
이동훈 시인 시는 한 단어, 한 연(聯)만 가져와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전체를 봐야 하는 단점이자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오래전, 산문집을 읽은 날 이렇게 써 뒀다. ‘스스로 ‘세기의 명작’, ‘역작’이라는 이 책은 그 얼개가 촘촘하게 구조화돼있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군침이 저절로 돈다. 한사람 시가 시대와 또 사람들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레 역사까지 알게 된다. 유행처럼 언급되는 ‘통섭’이란 이렇다고.
 |
| 지인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동훈 시인.(건너편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 이) |
시인은 평론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글 편들은 새삼 깊이와 해석이 유달리 빛난다. 章(장)과 章(장)을 잇는 내용은 서로가 가진 절망을 받쳐주는 다리다. 시인 이상으로 시작해 고흐에 이르고 장마당 국수 한 그릇과 잊힌 驛舍(역사)에 닿으면 일단 한번 쉬어야 한다. 이 시인 시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백팩을 메고 가는 표지 속 주인공인 시인이 가는 길과 방향으로 함께 나서면 된다.
‘몽실탁구장’을 읽는 키워드는 ‘뿐’에 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시집, 1부에서는 ‘시인의 생가는 시일 뿐’으로 시작한다. 2부는 ‘복(福)은 한 입 거리 수단일 뿐’이고 3부는 ‘실망은 기대의 후속편일 뿐’이라고 못 박는다.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가진 조사(助詞), 그것만 있고 더는 없는 ‘뿐’.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시인은 전해주고 싶었던 셈이다.
유독 그림을 사랑하는 작가다. 모두 시편들과 연결된다. 첫 페이지 김결수 ‘Labor & Effectiveness’에 이어 박홍순, 케테 콜비츠, 권도훈, 정태경 화가에 이어 사진가 정혜원 씨 ‘소혹성 사람들’까지 불러냈다. 이미지는 사람을 모으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그는 가둬 놓고 해방시키는 묘한 버릇이 있는 시인이다. 슬픔이나 절망을 한데 모아 두면 그 폭발력이 엄청나다. 문학은 ‘카타르시스’라는 데, 눈물 없인 입장 불가한 ‘몽실탁구장’은 문전성시(門前成市) 이룰 듯하다.
동네 탁구장에
몽실이를 닮은, 작은 체구에 다리를 조금 저는 아주머니가 있다.
상대의 깎아치기 기술로 넘어온 공은
되 깎아 넘기거나 살짝 들어 넘기고
강하고 빠르게 들어오는 공은
힘을 죽여 넘기거나 더 세게 받아칠 줄 아는 동네 고수다.
하루는 권정생 닮은, 빼빼 마른 아저씨가 탁구장에 떴다.
허술해 보여도 라켓 몇 개를 지닌 진객이다.
몸 좀 풀 수 있냐는 요구에
몽실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공을 받아주는데
조탑동의 인자한 그분과 다르게
이분은 탁구대 양쪽만 집중공략 하는 극단주의자다.
이쪽으로 찌르고 저쪽으로 때리기를 반복하니
불편한 다리로 한두 번 몸을 날려서까지 공을 받아주던
몽실 아주머니가 공 대신 화딱지를 날렸다.
- 이렇게 몸 풀려면 혼자 푸시고요.
- 남 욕보이는 걸 취미 삼지 마시라요.
늙으면 곱게 늙으란 말도 보탰는지 어땠는지
사뭇 사나워진 분위기에
권정생 닮은 아저씨는 허, 그것 참만 연발한다.
살살 치면 도리어 실례가 아니냐고
몇 마디 중얼거리긴 했지만 낭패스런 표정이 가시지 않는다.
이오덕처럼 바른말만 하는 관장의 주선으로
다시 라켓을 잡긴 했지만
이전보다 눈에 띄게 위축된 아저씨는 공을 네트에 여러 번 꽂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탁구엔
이쪽저쪽을 삥 뽕 삥 뽕 넘나드는 재미가 있다.
몸 쓰며 기분 내는 일이란
사람 사이 간격도 좁히는 것이어서
탁구장 옆 슈퍼에서
몽실 아주머니와 권정생 닮은 아저씨가 우유로 건배를 한다.
아, 이 재미를
오줌주머니 옆에 찬 교회 종지기 권정생은
평생 누리지 못했겠구나.
<이동훈 시, ‘몽실탁구장’, 전부>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