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철 시인 |
당연히 호기심이 동해 급하게 책을 펼쳤다.
한 스님이 남긴 동안거(冬安居)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평범은 비범과 같다는 말처럼 공감과 동감을 동시에 느꼈다. 속(俗)을 벗어난 승(僧)이 유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간을 따라갈수록 산다는 일은 거기나 여기나 비슷했다. 단지 욕심은 덜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니 정진을 위한 회초리는 됐다. 딱히 몇 년도 일기인지는 모른다. 어느 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록한 글이다. 책 끝에 소회(所懷)를 남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 15일부터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착오가 있는 모양이다. 아마 강 전 법무부 장관은 동안거 기간만 계수한 모양이다. 동안거와 하안거에는 공부철이므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봄과 가을은 산철이라 해서 일반 대중 출입은 자유롭다. 글 쓴 시점은 10월 1일이다. 지허(知虛) 스님이 이 날짜에 ‘나는 오대산의 품에 안겨 상원사 선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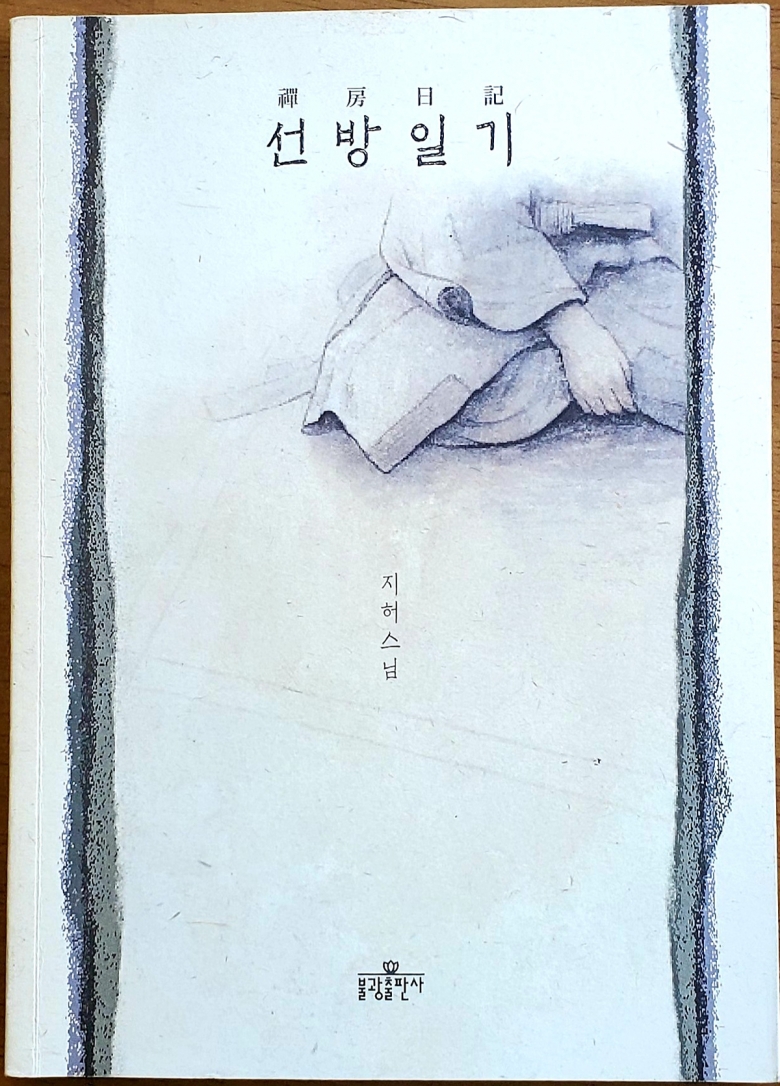
|
| 선방일기(禪房日記) 표지 |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저자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 풍문만 있고 실체는 없다. 지허(知虛)라는 법명도 확인할 수 없고 필명일 것이라는 주장,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기록, 탄허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는 일, 입적했다는 년도(1975년), 모두 정확하지 않다. ‘책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단지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식자(識者) 냄새는 지울 수 없다. 어찌 됐건 선방일기는 읽는 이들에게 던지는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말해도 되겠다. 종교에 관계없이 두루 찾는 이들이 많아 책이 오랜 기간 꾸준히 팔려나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3편 에피소드가 실린 일기는 매일이 아니다. 군데군데 날짜를 뛰어넘기도 한다. 그도 그럴 일이 수도 생활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는가. 70년대 전후 선방 생활을 들여다볼 기회이기는 하다.

|
| 김장 울력(내지 삽화이며 견동한 작가 그림을 촬영함) |
선방 생활도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일들이 많다. 사찰에서는 생활 외양은 공동이고 내용은 개인이다.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면 나름 질서와 약속은 있어야 한다. 삼동결제(三冬結制)에 임하는 참석자는 해야 할 일을 나눈다. 임무가 주어진다는 말이다. 책임자를 비롯 사무 총괄, 불공 담당, 대중 통솔, 심지어 군불을 때는 화력 담당까지 있다. 지허 스님 역할은 땔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었다. 흔히, 울력이라고 말하는 단체 노동은 함께해야 한다. 김장 울력, 메주 울력에는 예외가 없다. 선방 구성원이 다수이다 보니 이질감,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그리 큰 염려는 없다. 전체가 무시되고 개인 위주가 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참석자들은 자아 성찰이 목적이지 대의를 성취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비정하게 느껴지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자신이 도태되니 비정할수록 혼돈은 정리되고 조화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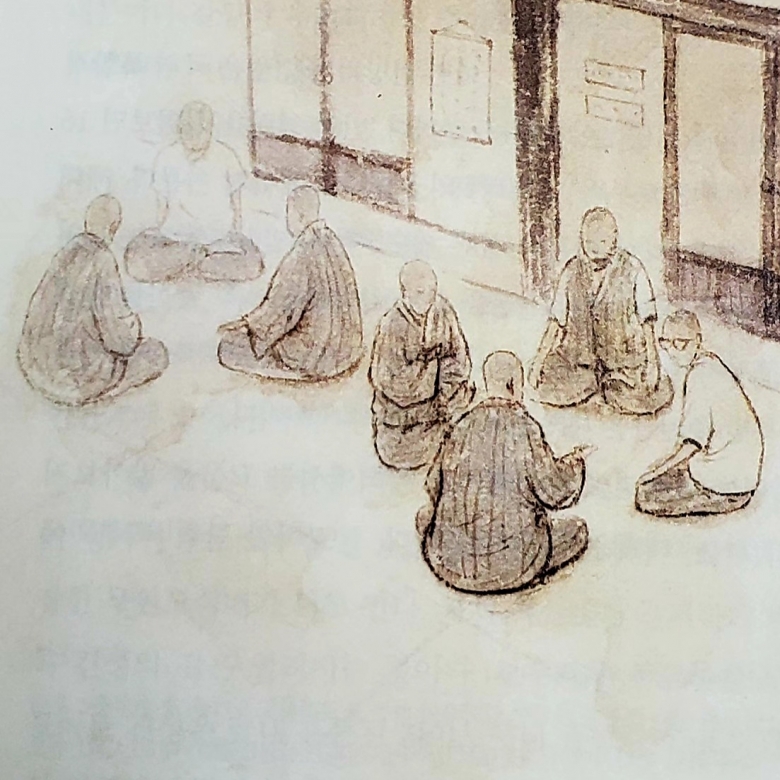
|
| 선방의 생태(내지 삽화이며 견동한 작가 그림을 촬영함) |
이렇게 시작된 선방일기는 수행자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프다가도 포복절도할 사건에 이르면 마구 웃음이 터지는 상황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선방 생활은 채우는 일이 아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특히 식‧의‧수(食‧衣‧睡)는 절대 부족이다. 일체 욕망과 단절하거나 일정 기간 유보하는 시간이어서다.
식사만 하더라도 아침은 조죽(朝粥)이란 말처럼 죽, 점심은 오공(五供)이라 하는데 쌀밥, 저녁은 약석(藥石)이라 해서 잡곡밥을 약간 먹는다. 간식이란 말 자체가 없다. 하루 급식량이 일 인당 세 홉. 부식은 채소류가 위주고 가끔 특식으로 두부, 김, 미역을 ‘개 보름 쇠듯’ 맛볼 수 있다.

|
| 별식의 막간(내지 삽화이며 견동한 작가 그림을 촬영함) |
수행자들은 늘 배고프기 마련이어서 호시탐탐 고방 문을 노리기 일쑤인데 강원도 감자는 예나 지금이나 유명하다. 상원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감자 서리를 해서 먹자는 대중 의견이 자연스레 모아졌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자주 이 짓을 하다 보니 들통이 날 게 아닌가. 살림살이 담당 스님(院主)도 이 일을 알고는 무턱대고 나무란 게 아니라 계책을 냈다. 밥때마다 섞어 내놓던 감자 비율을 높인 것. 부식도 매끼 마다 감잣국에 감자나물을 내놓았다.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을 향해 원주 스님 왈, “감자 먹기가 얼마나 포원이 되었으면 그 부족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자를 자시겠소. 스님들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감자 일변도 메뉴를 짰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감자 동맹은 끝나고 말았다.
선방일기는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아주 심각한 결단으로서 안거 생활은 차라리 책 내용만 본다면 더 인간 냄새가 난다.
하지만 슬쩍슬쩍 건드리고 가는 구도 과정은 경건하다. 수행 마지막 관문인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자신을 일으키는 대반전이다.
출가를 통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심각한 결단에도 인간미를 드러내는 여정에 감복한다. 지허 스님이 누군지 알 필요 없다.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참 수행자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법이라지 않던가. ‘용처시무처’(用處是無處)란 말처럼 날아간 새 흔적을 찾는 일도 어리석은 행동일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