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철 시인 |
최근 출간된 책, ‘디그로쓰’(degrowth)에 대한 생각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이 단어를 접해왔고 업무에 임할 때도 늘 염두에 있단다. 개념도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구 자정 능력(carrying capacity)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임을. 성장과 탈성장이라는 두 바퀴가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며 굴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구를 식히고 세계를 치유할 단 하나의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디그로쓰’. 흔히들 탈성장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뭔가 빠진듯하고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어가 가진 힘이자 얼마든지 변용 가능한 무서운 면이다. 탈성장에 담긴 성장 지양과 적정 성장이라는 뜻도 새겨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이다. 탈성장은 언뜻 생각하기에 성장 반대말로 비치는가 하면 무조건 반대로만 읽혀 의미도 채 깨닫기 전에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무엇보다도 Degrowth는 경제 규모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어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퍽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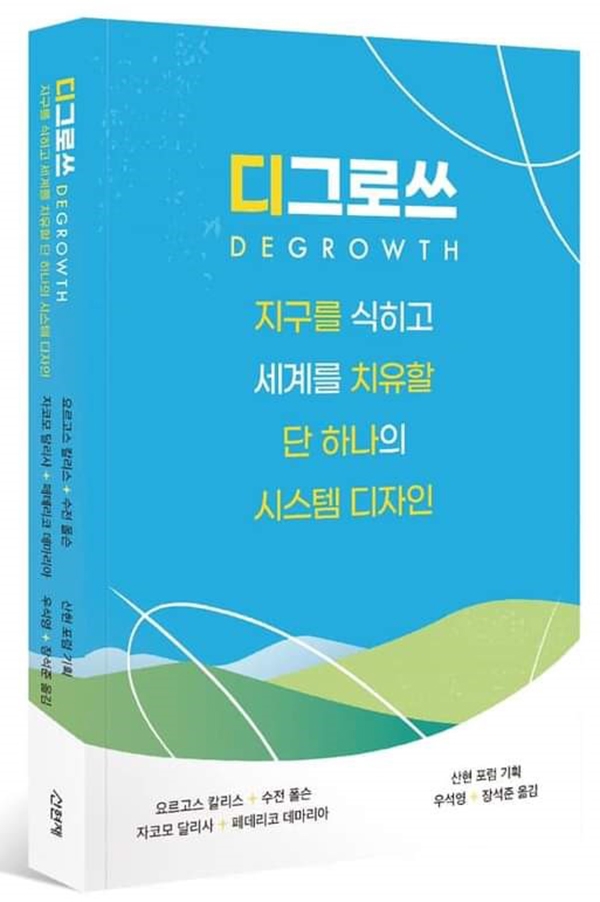
|
| ‘디그로쓰’ 책 표지 |
공동 번역자 중 한 사람인 생태주의자 우석영 씨는 “성장주의의 파괴적 면모를 일찍이 알아챈 해방의 전사들은 ‘탈성장’이라고 쉽게 번역하고 말해 왔다”고 지적한다. 또 “Degrowth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한 어떤 이들(아마도 성장주의에 아무 생각 없는 이들)은 ‘역성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고 한숨 쉬기도 한다.
그도 단어 하나가 가질 엄청난 힘과 권력을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어서 자탄하듯 속내를 밝힌다. “나는 여전히 이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라리 ‘디그로쓰’라고 하고 생각을 열어두자, 이렇게 제안했다. ‘탈성장’이라는 용어도 이미 대세가 돼 있어서 이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생각은 하고 이 용어를 쓰자는 말이다”
도를 넘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미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생태 불균형과 사회 질병 만연도 그 이유다. 2020년 4월 팬데믹이 선포됐을 때 당한 패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세력들이 출몰할 게 뻔하다. 위기를 가속시킨 셈이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러레이터를 택한 꼴이다.

|
| ‘찾아가는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설명회’ 현수막을 펼쳐 든 관계자들 |
암담한 미래다. 지금이라도 디그로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보라. 이미 찾아온 팬데믹(사실 처음은 아니다)을 시작으로 기후, 금융, 정치 위기 등이 몰고 올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이라도 회복 탄력성을 갖추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스톱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 일은 재난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논의는 계속돼야 하고 해결책은 광범위하게 공유돼야 한다. 그린 뉴딜, 공공투자, 일자리 공유, 기본 돌봄과 소득, 보편적 공공 서비스, 공동체 경제에 대한 지원 등 말이다. 코로나19는 인간과 환경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 중요한 변환점이다. 격렬하게 이익집단에 따라 나뉘는 소모뿐인 논쟁은 접고 더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평등, 사회 회복 강화를 위한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포와 감시, 통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책, ‘디그로쓰’는 그간 경제 성장 사생아로 전락한 지구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구촌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평무사한 정신을 이제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방법은 현재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 생태적 대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
| 필자 서재에 꽂혀있는 ‘종말’ 시리즈물? |
탈성장 이야기만 꺼내면 경기를 일으키는 집단이 있다. 불평등과 착취, 이익 추구에 익숙해져 있기에 변화를 싫어한다. 이들이 바로 탈성장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어두운 그림자이며 범인이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고 성장이 멈추면 빈곤이 가속화된다고 말한다. 따지듯 물어본다. 그동안 누린 경이로운 성장 결과를 뒤돌아봐라.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반성해야 할 시간인지 말이다.
부탄은 GNP(국민총생산)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나라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가 지향점이다. 생산보다 살아가는 의미를 충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을 우선순위로 뒀다. 19세기 유럽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 데려갔다. 탄광 속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면 카나리아는 위험에 빠진다. 즉시 나가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놓치면 모두 죽는다.
며칠 전 서재를 정리하며 찍어둔 사진을 본 지인이 묻는다. “웬 종말 관련 책이 그리 많아요?” ‘빈곤의 종말’,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급기야 ‘6도의 멸종’까지 있으니 그럴만하다. 이 책들은 모두 경고장이다. 마지막 카나리아 목소리일 수도 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한가지, 개인이 보여주는 결단력도 우습게 볼 일 아니다. 이런 행동과 실천이 모여 정책이나 제도 개혁 밑거름이 된다. 우리 세대를 끝장낼 종말이 아닌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경쟁과 경제보다 공동체 삶, 함께 나누려는 분투, 비난과 조종 대신 격려와 협력을 통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감(자기됨)이 요구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의문점은 마지막 부분, Q/A(묻고 답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