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기철 시인 | ||
| ⓒ 양산시민신문 |
나태주 시인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읽었다. 아니 느꼈다. ‘나’를 지우고 ‘너’를 일으켜 세운 한 마디. 나만 내세우는 세상에서 아, 멀리만 느껴지던 너라니.
시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패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한 편 한 편을 꾹꾹 백신 주사 놓듯 써 내려갔다. 문예지 ‘시에’에 그간 연재했던 시편들이다.
원래 시집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라고 정해 놓았단다. ‘그럼에도’ 앞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시집이 어쩌면 괜한 위로로 비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인은 시대를 안고 아픔을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다. 여기에 영리한 기획자이자 시인이 아름다운 개입을 해 그간 시인이 줄창 써온 ‘너’와 다시 만났다. 유달리 그간 낸 시집에는 ‘너’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 시 생명은 ‘나보다 너’에 있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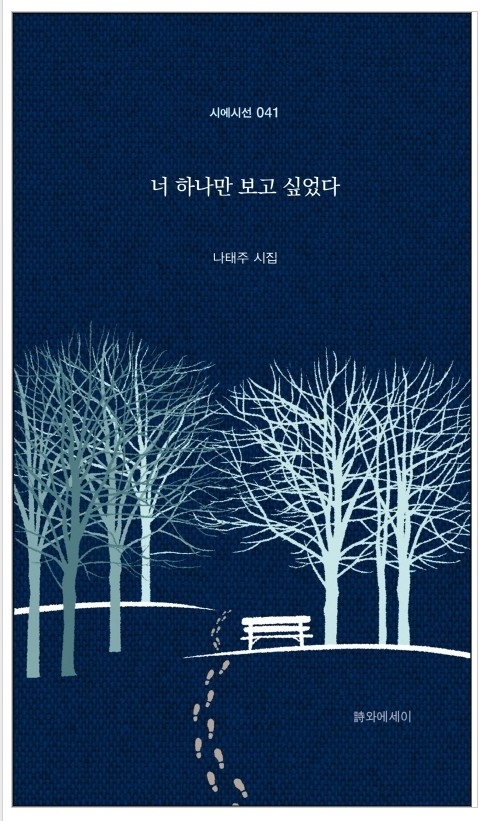 |
| ↑↑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표지 |
| ⓒ 양산시민신문 |
올해 등단 50주년 되는 해란다.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인은 사이코’라고 단정 짓듯 말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시를 짓지 못한다고. 보통 때 못 보던 것을 느낌이 오는 순간 써 내려가는 일이란다.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시가 찾아올 때 말이다.
99편 시가 수록된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세상 이보다 멋진 고백이 없다.
시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경험했다. 대표작 ‘풀꽃’(평소 자신은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이라고 말한다)이 그렇고 이 시집 제목이 된 맨 앞에 놓인 시 ‘외로움’이 그렇다. 외면하는 저쪽에 있는 ‘너’에 대한 무한 애정.
맑은 날은 먼 곳이 잘 보이고
흐린 날은 기적소리가 잘 들렸다
하지만 나는 어떤 날에도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나태주 ‘외로움’ 전문>
 |
| ↑↑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태주 시인 |
| ⓒ 양산시민신문 |
‘나’만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은 이제 지겹다 못해 환멸이 인다. 그가 쓴 시는 쉽고 간결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해꼽하지는 않다. 시인 윤동주가 쓴 ‘쉽게 쓰여진 시’가 가볍게 읽힌 적 있던가?
그가 쓰고 있는, 이미 쓴 시는 시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조근조근하게 그 이유와 아픔,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고 있다.
1971년 까까머리 중학교 2학년 때 박목월 시인 시를 만나 더욱 시를 사모하게 된 그는 운명처럼 그와 엮인다. 문단 등단 때, 그가 결혼하던 날 주례도 박목월 시인이 맡았을 정도니 말이다. 순수를 배우고 서정을 간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상처를 잊지 않는 시인.
‘시집도 안 가려는 시대에 시집(詩集)인들 팔리겠느냐’고 실없이 농담해보는 때이지만 다행히 그가 묶은 시집들이 몸을 세워 앞장서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기를 바라고 시작(詩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건지기 위해 쓴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하루다.
그는 이 세상을 털고 길 나서는 날, 묘지명에 이렇고 쓰고 싶다 했다. ‘고맙다. 잘 살고 와라’. 평생 ‘루저’로 ‘마이너’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듯 당신은 말했지만, 후회는 없는 글쟁이였음을 자신하는 마지막 당부다.
 |
| ↑↑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태주 시인 |
| ⓒ 양산시민신문 |
일본식 가옥을 고쳐 2014년에 문을 연 ‘풀꽃문학관’을 다녀온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낡은 풍금 닮은 선생님과 낮달처럼 걸려있는 시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다. 신록이 짙어지듯 그리움 따라 짙어가는 봄날이 가기 전에.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한 편 시를 더 두고 마음부터 달려간다.
생각만 해도 봄이 되고
가까이만 가도 꽃이 피고
어쩌나!
안기만 해도 바다가 된단다.
<나태주 ‘사랑’ 전문>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